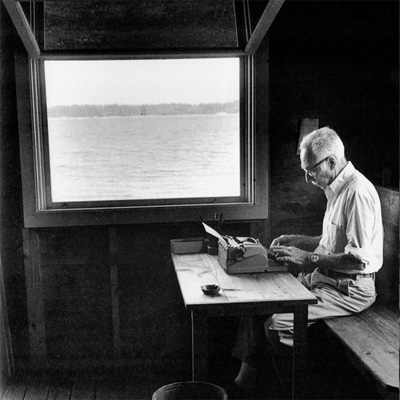정은숙
기쁠 것 같은 봄날 / 정은숙
네가, 어디 가 있느냐고
전화 메세지를 남기고 있을 때
나는 한강 언저리에서 졸고 있었네.
누구나 좋았겠다고 말할 그 풍경엔
바람도 있었고, 봄빛도 있었지.
그렇다고 정말 내가 좋았을까.
3월이었고 나는 떠날 이유를 찾고 있었지.
철학서를 베고 누워서
스물한 살의 젊음을 조롱하던 봄빛도
아닌, 이젠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
너는 수긍치 못할 것이다.
한번도 제대로 시작해 보지 못한
여행의 끝을 보고 싶은 마음을.
이 졸음 끝에 묻어나는 안락함이
몸에는 영 맞지 않는다.
돌아갈 서울을 향해, 뻗었던 다리를
모으고 다시 한번 한강을 바라본다.
나는 대답하리라. 어디에도 가지 않았노라고
단지 잠깐 기쁠 것 같아
봄을 맞으러 갔을 뿐
그것뿐이라고.
김미선
미로 / 김미선
여자는 2층 유리창 아래를 내려다본다. 지하철 역 광장에 아침 햇살이 팽팽하게 비춰든다. 어둠 속에 구겨져 있던 온갖 사물들이 아침 햇살에 주름을 펴는 시간이다. 광장 왼쪽에 조성된 소나무 숲에도, 화단 경계석에도 투명한 햇살이 들어찬다. 광장 바닥에 떨어져 내린 햇빛 조각을 비둘기들이 쪼아대고 있다. 순간 지하철 7번 출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람들은 버스정류장으로 휩쓸려가거나 횡단보도 앞으로 몰려간다. 순식간에 지하철 7번 출구는 텅 비어버린다. 하지만 오늘도 빨간색 배낭을 멘 남자는 7번 출구 앞에 미동도 없이 서있다. 반삭한 머리와 창백한 얼굴, 비쩍 마른 몸매도 여전하다. 남자는 왼 발은 약간 앞으로 내밀고 팔꿈치는 허리춤에 바짝 붙인 채 허공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내어 밀듯이 프, 쓰, 라고 반복해서 외쳐댄다. 봄부터 여름이 다 지날 때까지 저렇듯 7번 출구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