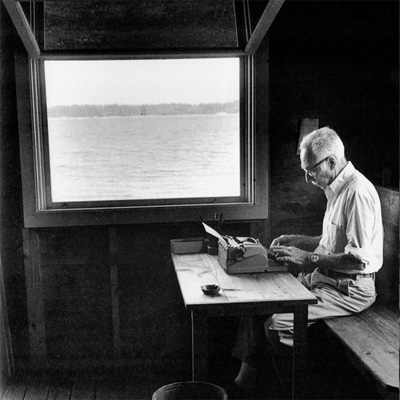이달의 시
그렇게 큰 부산
영도다리 건너
슬픔은
상처는
광복동쪽과 마찬가지로
여전해야 했다
전화번호도 알리지 않는 명조체 간판의 병원과
골목 깊숙이 외딴 여관을 지나
평일이라 덜 복잡했을 해변길에
저기서 떴다 여기로 지던 용왕의 석양과
어슴푸레하게 바다로 향한 사람의 창문을 번갈아 보며
증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다로 모이는 거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길가의 가게에서
새로운 상처일 수 있는
악세사리를 사서
가슴 쪽에 달고
계단의 가파름
겨울의 추움
여름의 더움을
적절한 비밀처럼
소곤거렸다
그런데 꺾어지는
골목마다
먼 바다가 불쑥불쑥
튀어 오르니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다
3월의 시
이채형
사과나무 향기 / 이채형
마을을 벗어나 강변에 잠시 차를 세웠다. 강변주위는 온통 과수원으로 빼곡이 들어차 있었다. 먼 지난날에는 몇 군데뿐이었고 그 뒤에 차츰 들어서기는 했지만, 걸음이 뜸했던 사이에 이렇게 과수 단지로 변해 버린 줄은 몰랐다. 마침 과수원에는 사과꽃이 한창 이었다.
불어오는 바람에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울타리 너머 과수원에는 줄지은 나무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촘촘히 매달린 꽃들 사이로 잉잉거리는 꿀벌 Ep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한순간에 지난날의 시각과 청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아아, 저 꽃과 벌들의 낙원!
문득 사과나무 아래 낯익은 한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한껏 목을 젖히고 눈가에 손을 붙인채 꽃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꽃 사이로 부산하게 날고 있는 작은 꿀벌들이 보인다. 은은한 날개짓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 나온다. 아이는 신기한 표정을 지은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어느 순간, 희한하게도 아이의 머리 위로 무지개가 떴다. 아이가 무지개를 타고 나무 위로 오른다. 아이 주위로 꿀벌들이 모여든다. 아이의 모습이 금방 꽃과 꿀벌 사이에 묻혀 버리고 무지개만 가지 사이에 걸려 있다. 더없이 평화로운 시간이 흐른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마당 가득 환한 달빛이 차 있었다. 달빛이 하얀 사과꽃을 솜처럼 부풀려 놓은 채 꽃잎 하나하나를 헤집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사과나무 아래로 다가가 까마득한 지난 어느 때처럼 나무를 우러렀다. 불현듯 다시 사과나무 향기가 나를 감싸 안는 듯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맞닥뜨린 건 벗어버려야 할 기억이 아니라 끝까지 짊어져야 할 고통이라는 것을. 사과나무의 옹두리는 지워 버릴 수 있는 흉터가 아니라 결코 지워지지 않을 내 생의 무늬란 것을.
한순간, 화르르 머리 위로 꽃잎이 쏟아져 내렸다.